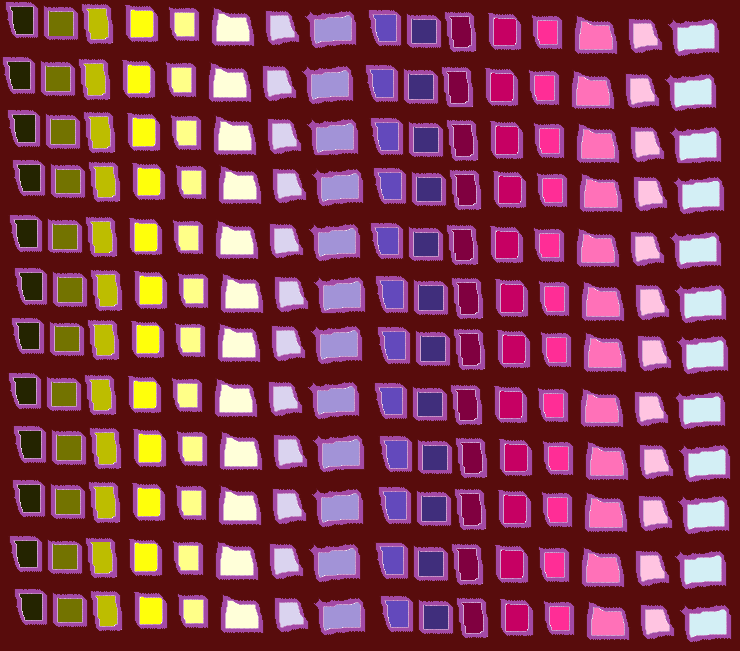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또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그 역시 욕먹을 일이 아니다. 우린 정치적 자유가 있는 사회니까. 현대사회가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개념이 없다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폄훼할 근거도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는 투표할 자유가 있는 만큼 투표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대해 공동체가 책임을 나누어지면 되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니까.
바로 이 지점,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우린 투표라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유권자의 태반은 누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단 누가 너무 싫어서 역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다. 누가 되는 건 정말 싫으니 탐탁지 않아도 가장 싫은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대충 싫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 그래서 선거란 차악을 선택해서 최악을 피하는 거란 생각이 만연하다.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신날 리 없다. 그러나 기꺼이 지지했던 정치인도 변하는 모습을 보면, 또는 포장된 이미지가 벗겨지며 실체가 드러나면, 나의 선택이란 것이 그다지 대단치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 정보가 없을 땐 없어서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도무지 선택이란 게 쉽지 않다.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본 사람은 안다. 찾을 땐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정답을 보고 나면 그때부턴 그것만 보인다는 것을,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인식력의 한계라는 것을. 뻔히 눈앞에 보이는 틀린 그림 찾기도 그러한데 하물며 조각난 정보와 부분 진실로 이루어진 현실에서야 오죽할까. 그러니 우린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 고립되고 인지 부조화에 빠진다. 잘못된 건 내가 아니라 타인과 세상이 되어야 하기에.
기독교에서 종말의 시대는 민족종교에선 해원의 시대다. 가슴속에 맺힌 원통함을 푼다는 건 순리에 맞는 일이지만 그만한 아수라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파괴 후에 창조가 오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절로 좋아질 순 없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종말이며 해원의 시대, 그래서 온갖 욕망이 최대치로 폭발하고 갖가지 원망과 분노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 어쩔까, 이런 파괴의 시대엔 각자 자신을 지키는 것,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광적인 욕망에 휩쓸리지 않는 것, 시대의 광기에 떠밀려가지 않는 것, 그 외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지 않을까 한다.
그러니 마음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되 그 마음을 거두는 일에도 주저하지 말자. 다행히 우린 냄비근성이란 민족의 유전인자가 있지 않은가. 오늘날처럼 역동적인 사회에선 빨리 끓고 빨리 식힐 필요가 있다. 왜냐, 신념은 독선일 수 있고 일관성은 독단일 수 있기에. 왜냐, 내가 인간이라서, 나 역시 부분 진실에 인식이 왜곡될 수 있는 인간이라서, 언제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열어 두지 않으면, 내가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광신도 되는 거 순식간이다. 그러면 상대는 태극기부대고 문빠고 일베고 메갈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상대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괴물 중 하나로 규정되고, 나는 그런 괴물과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가 돼버린다.
무섭지 않은가, 자신을 정의의 사도라고 믿는 순간부터 내 눈엔 괴물이 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공포영화가 현실이 돼도 가상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다면? 이렇게 죽을 때까지 스크린 속에서 또는 책장 속에서 내가 만든 캐릭터에 빙의해 평생 연기하게 된다면? 나의 실체는 사라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허구의 등장인물로 살다 죽는 것, 소름 끼치게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 흔들리고 좌절하고 변절하자. 그렇게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거리 두자.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의 대단함은 후회와 반성에서 오는 거지 결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경계인이 된다는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니체의 권력 의지와 한국형 갑질의 차이 (0) | 2021.07.11 |
|---|---|
| 공정이 뭐?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 2021.07.08 |
| 실존주의와 자살, 죽음을 의지해도 될까? (1) | 2021.06.27 |
| 자이가르닉 효과와 음모론의 관계 – 세월호, 천안함, 손정민 (0) | 2021.06.18 |
|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 사건_이준석 돌풍, 손정민 비극 (0) | 2021.05.24 |